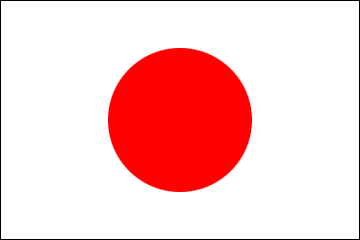제주의 신을 모시는 ‘당’~일본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 제주의 민간신앙의 무대
2021/6/25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제주에서 근무한 이세끼 요시야스 전 총영사가 제주의 다양한 장소와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며, 제주도민 여러분의 도움으로 연재 기사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제주와 일본의 깊은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의 기사 내용은 연재 당시의 것으로, 일부 내용은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의 기사 내용은 연재 당시의 것으로, 일부 내용은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지금까지 제주 탄생의 땅인 ‘삼성혈’과 제주의 전통 굿인 ‘칠머리당영등굿’ 참관을 통해, 제주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애니미즘과 샤머니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제주의 각 마을에는 일본 각지의 ‘진쥬(鎮守)’ 신이나 오키나와(沖縄)의 ‘우타키(御嶽)’와 같은 느낌을 주는 것으로 신을 모시는 신성한 장소인 ‘당’이 있는 것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이세끼 요시야스 총영사와 ‘칠머리당영등굿’을 함께 참관하며 설명하셨던 문화인류학자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현승환 교수님께서 제주의 ‘당’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주의 ‘당’ 방문
높은 ‘신구밀도’를 자랑하는 제주답게 신을 모시는 ‘당’의 수도 많습니다. 현승환 교수님의 부친이신 故 현용준 제주대 교수님께서 1985년 일본에서 출간한 『제주도 무속의 연구』에 따르면, ‘행정구역 215리(里)에 평균 1.3개씩’, 제주도의 2009년 조사에서는 359곳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본토에서도 ‘당’이 남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던 것이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많이 사라진 반면, 제주에서는 이 정도로 ‘당’과 전통적인 민간신앙이 면면히 유지되어 왔다는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이번에 다시금 제주의 ‘당’을 방문하고, 신의 존재나 전통적인 신앙을 뿌리 깊게 느꼈다는 점에서, 일본의 각 마을에 있는 ‘진쥬’의 숲이나, 오키나와, 아마미(奄美) 지방의 ‘우타키’와의 유사성을 실감했습니다만, 현승환 교수님에 따르면 제주의 신앙과 일본의 본토나 오키나와, 아마미의 그것과는 불교∙유교와의 관계, 정치 체제의 관여, 남녀의 역할 분담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면서도 차이점도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민간신앙과 구조물∙남녀의 역할분담
먼저 제주의 경우 고유한 토속신앙을 바탕으로 본토에서 들어온 불교의 영향이 가미된 신앙이 전승되었고, 13~14세기에는 원나라의 직접 지배를 통해 몽골불교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이후 조선왕조 하에서 국교인 유교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사회는 ‘당’을 중심으로 한 토속적인 무속신앙에 의존하는 한편, 남성사회에서는 ‘포제단’을 중심으로 유교식 의례에 의존하는 민간신앙의 이중구조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의 형태도 소박하고,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기껏해야 작은 제단이나 사당이 있는 정도입니다.일본의 민간신앙과 구조물∙남녀의 역할분담
다음으로 일본 본토입니다만, 6세기무렵으로 여겨지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당초에는 현재의 신도(神道)로 이어지는 토속신앙과의 경합이 일어났지만, 8세기 나라시대(奈良時代) 이후, 점차 신도∙불교 양쪽 모두를 신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절충되게 됩니다. 10세기에는 『엔기시키진묘쵸(延喜式神名帳)』 편찬으로 국가에 의해 전국의 주요 신사가 목록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신도의 교리나 신사의 구조물의 형태에 관해서도 불교와의 상호작용으로 고도화된 면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대의 히미코(卑弥呼)(야마타이코쿠(邪馬台国)의 여왕)의 예는 말할 것도 없이, 미에현(三重県)의 이세(伊勢)신궁이나 교토(京都)의 가모(賀茂)신사의 제사에 미혼인 황녀가 봉사했던, 사이구(齋宮) 의례법이나 사이인(齋院) 의례법의 역사를 보아도 원래는 매우 큰 역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아오모리현(青森県)의 무당 ‘이타코’와 같은 재야 신앙에는 여성이 중심이 되는데, 현대에 신사의 의례는 남성이 다수인 신관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무녀는 남성 신관을 보좌하는 보조적인 역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키나와, 아마미 지방의 ‘우타키’에는 제주의 ‘당’과 마찬가지로 작은 제단이나 사당이 있는 정도입니다(입구에는 토리이(鳥居)(기둥문)가 세워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런데 류큐(琉球)왕조에서는 정치체제와 남녀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게도,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남성에 의한 중국 왕조형 관료지배체계(유교가 전제가 됩니다)와 함께, 왕족 여성이 역할을 맡는 기코에오키미(聞得大君)를 정점으로 각 마을에 배치된 무녀인 ‘노로’(축녀)에 이르기까지 여성에 의한 종교지배 체계가 병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체계 이외에도 여성 무당이 주체인 ‘유타’를 사람들이 신앙하고 있음을 지금도 오키나와, 아마미 지방 각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주와 일본의 신을 모시는 모습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까?
이상 현승환 교수님과 ‘당’을 방문하여 제주의 신을 느꼈던 것을 계기로,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아마미 지방에 있는 각각의 신을 모시는 모습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기도 하고, 아직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현승환 교수님의 말씀대로 “제주와 일본은 알타이∙퉁구스로부터 북방의 영향,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온 남방의 영향, 그리고 도교의 영향이 혼재된 애니미즘∙샤머니즘을 전통문화의 근저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한 그 균형이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유사하다”고 최소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각각의 신이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없겠지만, 다른 땅의 신에게서 왠지 모를 애틋한 친근감을 느낀다는 것도 실은 꽤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방문 관련사진

△송당 ‘본향당’
제주에 많은 ‘당’ 중에서도 이곳은 특별한 존재. 그 이유는 송당리 지역의 신화(제주에서는 ‘본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에 따르면, 바다를 건너 제주로 온 여신이 낳은 여덟 명의 자식들이 제주 전체에 흩어져 각 지역의 신이 되었다는 것으로, 송당의 ‘당’이 제주 전체 ‘당’의 발상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총본산’인데, 매우 간단한 구조로 돌로 이루어진 울타리로 배후의 숲과 구분되어 그 바로 앞에 제단이 있고, 그 위에 작은 석조 사당이 세워져 있습니다(왼편에는 건물도 있는데, 최근에 새로 지어진 것으로 원래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승환 교수님에 따르면 석조 사당 안에는 제례에 사용되는 신의 옷을 접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장마가 끝나면 그 옷을 햇빛에 말리는 의례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송당리가 현재는 제주도 내륙에 위치하고 있지만, 부근에 남겨진 모래, 조개껍질 그리고 바다를 향해 흐르던 용암굴 속 종유석을 감안하면, 오래 전 바다가 가까웠으며, 사람들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고 보여, 신화에서 송당이 제주의 중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주와는 신의 계통이 다름에도, 최근 한국 본토에서 일부러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속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어, 본향당을 소중히 지켜오신 지역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일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흘 ‘본향당’
또 한 곳, 와흘리 본향당도 방문하였습니다. 수령이 400년을 넘었다고 하는 팽나무 거목이 인상적입니다만, 화재∙낙뢰로 인해 나무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어,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밖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꽤 넓은 공간입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당 ‘본향당’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합니다. 팽나무 줄기에는 형형색색의 천이 감겨 있어, 마치 신체를 소중히 지키려는 듯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흰 천을 묶고 기원을 드린 흔적도 보였는데, 현승환 교수님에 따르면 일본의 신사나 절에서 점괘를 나무에 매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나치 오타키(那智の大滝)
일본의 유명한 신사는 훌륭한 신전을 가진 곳이 많습니다만, 고대로부터 신봉해 온 미와산(三輪山)을 신체(神體)로 하는 나라현(奈良県)의 오오미와(大神)신사처럼, 현재에 이르러서도 ‘배례전(拝殿)’은 있지만 신의 주거가 되는 ‘본전(本殿)’은 없는 식의 고대 신앙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사진은 제주와도 인연이 깊은 와카야마현(和歌山県)에 있는 유명한 ‘나치의 오타키’인데, 실은 이 폭포 자체가 구마노 나치타이샤(熊野那智大社)의 별궁인 히로우(飛瀧)신사의 신체로 ‘배례전’도 ‘본전’도 없이 폭포의 웅덩이 앞에서 직접 참배합니다.

△오키나와의 세화우타키(斉場御嶽)
오키나와 본섬 남부의 난조시(南城市) 지넨(知念)에 위치한 세화우타키. 세계유산에도 등록되어 있는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우타키로 류큐왕국에서는 최고의 신관으로 왕족여성이 임명된 기코에오키미(聞得大君)의 즉위식인 우아라우리(御新下り) 행사도 거행된 성지입니다. 하지만 작은 제단 이외에는 구조물은 찾을 수 없습니다.

△돌하르방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왕조 시대에 조선은 전통적인 무속신앙과 절충하면서 국교인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은 그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외부로부터의 액막이로 집이나 마을의 출입구를 지키는 신앙의 상징인 돌하르방은 무속의 신체였다면 당연히 배척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관청이 주도하여 성문의 수호신으로 설치했다는 점은 민간신앙을 관청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액막이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나무라면 신사의 토리이(鳥居), 돌이라면 ‘오지죠상(お地蔵さん)’(지장보살)이나 ‘도소진(道祖神)’(석상(石像)으로 행인을 지키는 신)이 떠오르지만, 이런 것들과 돌하르방과의 관계성은 문화 인류학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진 속 돌하르방은 사실 제주가 아니라 무려 일본 일본 도쿄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제주시의 우호도시인 도쿄도(東京都) 아라카와구(荒川区). 그 구청 앞에 있는 아라카와 공원에, 2009년에 제주시가 보낸 높이 약 2미터의 돌하르방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사진 제공:구리스 후토시(栗栖太) 도쿄대학 준교수∙전일본 학생경기댄스연맹 회장)
관련기사
・제주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신의 축제 ‘칠머리당영등굿’~일본의 신을 모시는 문화와의 공통성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_ko/11_000001_00239.html
・제주들블축제~들불 놓기 문화로 본 제주와 일본의 인연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_ko/11_000001_00229.html
・한라산~일본 문화인류학의 뿌리의 한 줄기를 찾다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_ko/11_000001_00211.html
・국가등록문화재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일본에서 배운 한국 최고의 ‘나비박사’이면서 제주 연구의 선구자가 초대 소장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_ko/11_000001_00262.html
・[칼럼]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며 찾았어요, 제주의 ‘OKINAWA’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_ko/11_000001_00231.html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오키나와∙규슈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촬영 항공사진 소장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_ko/11_000001_00161.html
・아쿠아플라넷 제주~오키나와 ‘츄라우미(美ら海) 수족관’과도 인연이 깊은 제주도 최대 수족관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_ko/11_000001_00214.html